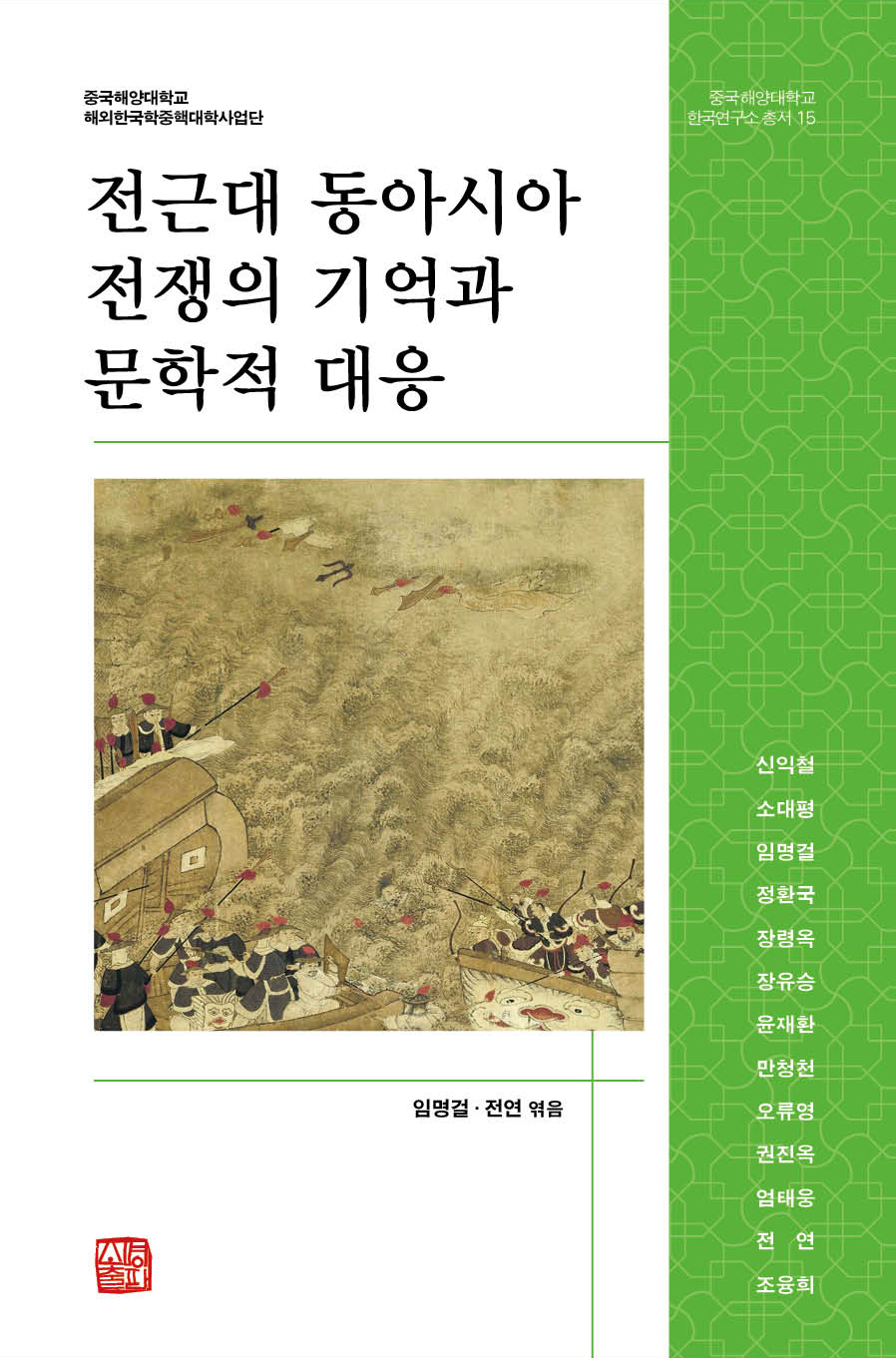출간 도서
도서 상세보기
| 저자 | 신익철, 소대평, 임명걸, 정환국, 장령옥, 장유승, 윤재환, 만청천, 오류영, 권진옥, 엄태웅, 전연, 조융희 | 역자/편자 | 임명걸, 전연 편 |
|---|---|---|---|
| 발행일 | 2025-05-31 | ||
| ISBN | 979-11-7549-010-9 (93810) | ||
| 쪽수 | 408 | ||
| 판형 | 152*223, 각양장 | ||
| 가격 | 34,000원 | ||
근대 이전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
근대 이전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은 한자 문명을 공유하며 오랜 세월 긴밀하게 교류해 왔다. 이웃한 세 나라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고유한 문명을 건설해 왔지만, 때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며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면서 삼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민감한 지역으로 삼국 전쟁의 무대가 되곤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1592년부터 7년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한·중·일 삼국이 참여한 이 대전란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탄생시키게 된다.
동아시아 삼국이 바람직한 공동체적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상호 공통된 견해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해양대학교에서 '전근대 동아시아 전쟁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2023년 10월에 개최된 위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12편의 글에 병자호란시기의 인물 형상화를 논의한 엄태웅의 글 한 편을 추가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애당초 각기 관심 있는 사안을 자유롭게 발표한 것이기에, 주제를 분류하여 엮기가 쉽지 않았다. 고심 끝에 '한반도의 전쟁 체험과 문학적 대응'과 '한·중·일 전쟁의 기억과 소환 방식'이라는 제목 하에 제1, 2부로 나누어 묶어 보았다. 이제 이 책에 수록된 순서에 따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한반도와 전쟁 체험과 문학적 대응'은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기인하여 산출된 문학작품을 다룬 8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관한 것이 3편이고, 임병양란을 다룬 것이 1편, 고려시대의 전쟁을 다룬 것이 1편, 전쟁 예지담(豫知談)과 예지서(豫知書)에 관한 것이 1편이다. 신익철의 글은 1592년 평창 응암굴(鷹巖窟) 전투를 배경으로 지어진 실기(實記) 2종을 소개하면서 그 저술 의도와 서사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소대평(肖大平)의 글은 신경(申炅)이 편찬한 역사서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에 수록된 한시의 기능과 문학성을 고찰한 글이다. 임명걸의 글은 「최척전(崔陟傳)」이 지닌 역동성과 탁월한 문학적 성취가 미래적 삶의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공간을 다룬 데서 획득되고 있음을 해명하였다. 정환국은 임병양란을 소재로 한 야담에서 전란을 기억하는 방식이 전란 자체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쪽이 아니라 왕조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당위성으로 이용된 혐의가 짙다고 보았다. 장령옥(張玲玉)의 글은 고려 대 송·원 전쟁 관련 외교문서를 정리하고, 여기에서 전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장유승은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에 기반해 자연의 이상현상을 전쟁의 조짐으로 본 데서 예지담이 생겨났고, 『천문유초(天文類抄)』 등의 예지서가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수용됐음을 밝혔다.
제2부 '한·중·일 전쟁의 기억과 소환 방식'은 한·중·일 삼국에서 전쟁이 기억되며 소환되는 양상을 다룬 글 7편을 수록하고 있다. 윤재환의 글은 임진왜란에 대한 세 나라의 시각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17~18세기 삼국의 한시에서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만청천(萬晴川)의 글은 명·청 문학에서 임진왜란 관련 인물들이 형상화되는 측면을 고찰하였고. 오류영(吳留營)의 글은 고가세리(古賀精里) 부자의 글을 중심으로 에도시대 조선 사신과의 '문장을 통한 힘겨루기'에는 전쟁의 욕구가 숨어있음을 해명하였다. 권진옥의 글은 전근대 전란과 관련하여 귀화한 인물이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본 글이고, 엄태웅의 글은 병자호란의 중심 인물인 용골대(龍骨大)가 조선 후기 서사문학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해명하였다. 조선의 문인들이 중원이 이민족의 치하에 들어간 역사적 격변기를 환기하며 전란을 기억하는 방식에 주목한 글 또한 두 편이 실려 있다. 전연의 글은 임병양란으로 인해 조선의 문화적 자존 의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송(宋) 왕조가 이민족에게 멸망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고 하면서, 조선 후기의 '송망(宋亡)' 담론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융희의 글은 조선 후기 연행사가 대릉하(大陵河)에서 영원(寧遠)에 이르는 노정을 지나면서 명청 교체기 송금전투(松錦戰鬪)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쟁의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을 해명한 글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 책에 수록된 13편의 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비롯하여 송나라의 멸망 및 명청 교체기의 송금전투 등 다양한 전쟁의 기억을 다루며 그 의미를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조선에 귀화한 인물 및 청 장수 용골대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기억 및 한·중·일 세 나라의 문인들이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시선 등까지 두루 살펴보고 있다. 모쪼록 이러한 다양한 전쟁의 기억과 그 문학적 형상에 대한 고찰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동아시아 삼국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
제1부 | 한반도의 전란 체험과 문학적 대응
신익철_ 『호구일록(虎口日錄)』과 『응암지(鷹巖誌)』를 통해 본 실기문학의 기록과 전승의 두 층위
소대평_ 조선시대 문인 신경(申炅)의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에 수록한 한시 연구-'유시위증(有詩為證)'으로 시작하는 한시를 중심으로
임명걸_ 『최척전』 연구
정환국_ 조선 후기 전란을 기억하는 몇 가지 방식-전란 소재 야담의 양상에 주목하여
장령옥_ 고려 대 송·원 외교문서 중의 전쟁 표현
장유승_ 전쟁 예지담과 예지서
제2부 | 한·중·일 전쟁의 기억과 소환 방식
윤재환_ 하나의 전쟁, 세 개의 시선-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중·일 세 나라의 시선
만청천_ 기억의 각인 및 재구성-명·청 문학 속 '임진왜란' 인물 형상
오류영_ 귀방(貴邦)과 접이(鰈夷)-고가 세이리 부자의 한국에 대한 입장과 임진전쟁 담론
권진옥_ 전근대 한국의 전란(戰亂)-귀화인(歸化人)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엄태웅_ 고전서사 속 용골대 인물 형상화의 다기한 양상과 그 의미
전 연_ 은유·대응·재구-임병양란과 조선 후기의 '송망(宋亡)' 담론
조융희_ 조선 후기 연행록에서 환기되는 전쟁의 기억-'연행록사전 DB'를 활용한 송금전투(松錦戰鬪)의 기억 양상 고찰
필자소개
지은이
신익철 申翼澈, Shin Ik-cheol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대평 肖大平, Xiao Daping 기남대학교 중국문화대외전파협동창신센터 조연구원
임명걸 任明杰, Ren Mingjie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정환국 鄭煥局, Jung Hwan-kuk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장령옥 張玲玉, Zhang Lingyu 호남사범대학교 중문학과 박사후
장유승 張裕昇, Jang Yoo-seung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윤재환 尹載煥, Yoon Jae-hwan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만청천 萬晴川, Wan Qingchuan 양주대학교 중문학과 교수
오류영 吳留營, Wu Liuying 상하이사범대학교 중문학과 부교수
권진옥 權津鈺, Kwon Jin-ok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엄태웅 嚴泰雄, EOM Tae-ung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연 田娟, Tian Juan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조융희 趙隆熙, Jo Yoong-hee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엮은이
임명걸 任明杰, Ren Mingjie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전연 田娟, Tian Juan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