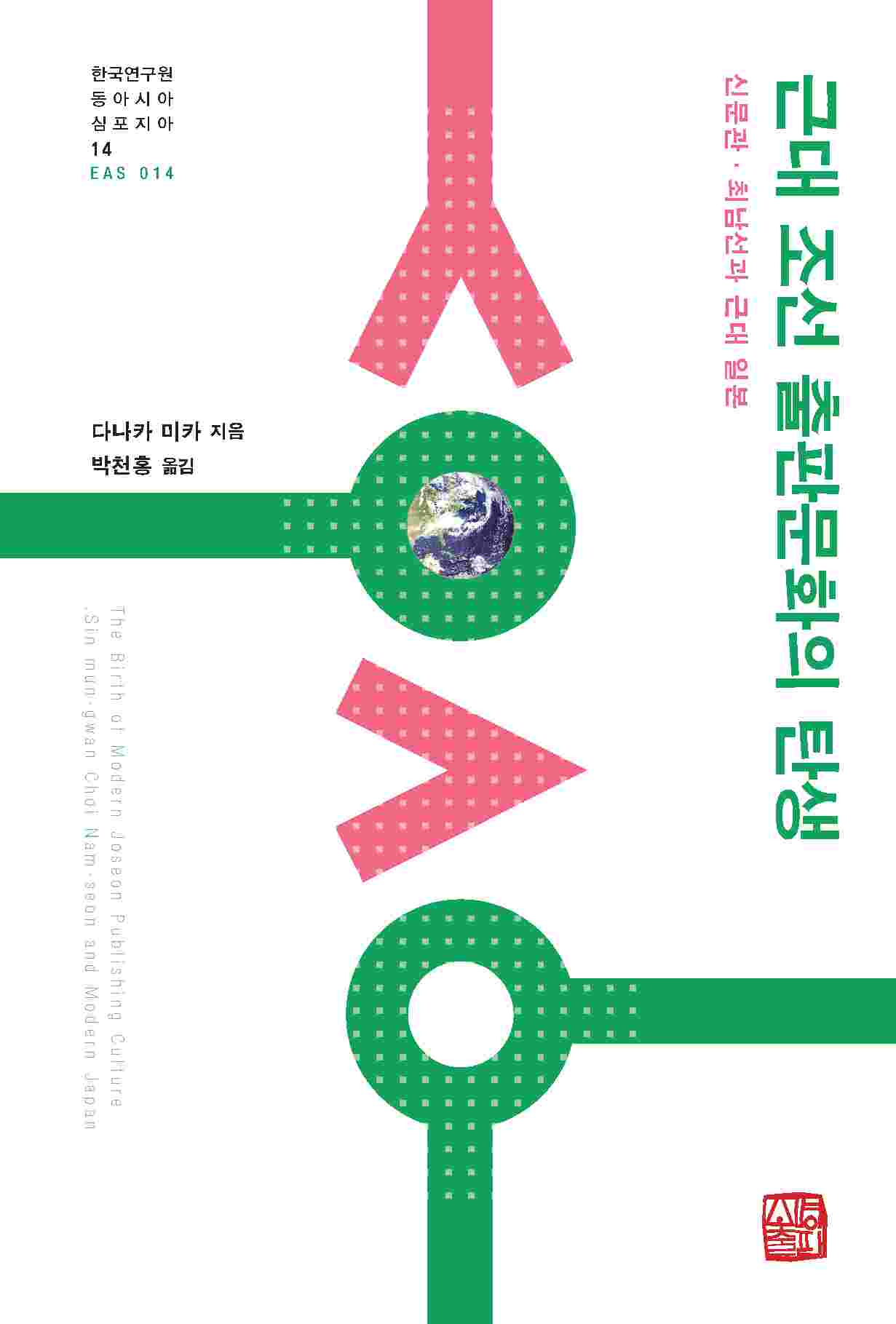출간 도서
도서 상세보기
| 저자 | 다나카 미카 | 역자/편자 | 박천홍 |
|---|---|---|---|
| 발행일 | 2025-04-30 | ||
| ISBN | 979-11-5905-853-0 (93810) | ||
| 쪽수 | 500 | ||
| 판형 | 152*223 양장 | ||
| 가격 | 40,000원 | ||
근대 조선의 출판을 통해 현대 사회를 이해하다
‘출판’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실마리이다. 한국은 1970년대 말에 한국어의 총출판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뒤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출판대국의 지위를 구축했고 1990년대에도 세계8위에 오르는 등 그 추세를 유지해왔다. 오늘날의 출판 불황에도 IT 강국 한국에서는 가장 빨리 전자화가 진행되었는데 2017년에는 전자책이 잡지를 제외하고 전체 출판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인터넷 서점의 약진은 눈부실 정도다. 더하여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신문과 잡지에서 속속 한국의 소설이 다루어지고 한국문학 붐이 일어나는 등 바야흐로 지금 한국의 출판계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화의 중심에 있는 ‘출판’이 어떤 형태로 시작 및 발전해왔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대 조선을 고찰할 때 ‘출판’에 주목하는 데는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에 따라 개국한 조선은 러일전쟁의 결과 1905년에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가 되었다. 조선에서는 특히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한 1905년 이후 항일운동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사상이 들어옴에 따라 여러 종류의 민족운동과 문예활동 등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토대에는 책과 잡지, 신문 등의 출판물이 있었다.
이 책은 근대 조선 출판의 중심에 있었던 최남선을 비롯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일본의 문헌을 활용해서 민중계몽을 의도하고 독자적인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려 했는가, 그것을 밝히고 있다. 또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참고한 일본의 출판계는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조선에서 출판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 이 책의 시도는 조선의 출판 역사를 세계사의 틀에서 파악하는 작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최남선과 신문관
이 책은 근대 조선에서 출판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해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동시대에 조선과 일본의 출판계가 관계 맺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일국사(一國史)’를 뛰어넘는 관점에서 그 목적에 접근한다. 이러한 목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문관의 창설자 최남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최남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자로서 최남선의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리고 최남선을 민족주의자로서 칭찬하거나, 또는 반민족주의자로서 단죄하는 것처럼 ‘저항/협력’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시점과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원론적으로 최남선의 출판 활동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밝히려는 연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역사학자의 측면뿐만 아니라 최남선의 민족 개념에 대한 분석 기행문과 종교 관련 저작에서 시, 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에 초점을 맞춰 문학가의 측면에 주목한 문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까지 보아온 것처럼 최남선은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닌 인물이다. 이 책은 그 가운데서도 최근 한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출판인 최남선의 한 측면과 최남선이 설립한 신문관에 대해서 역사학적 관점에서 고찰을 시도한다. 근대 조선에서 출판문화의 기초를 쌓은 신문관에 대해서 잡지 및 단행본 등, 간행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레이아웃과 같은 형식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시야로 바라보고자 했다.
한국어판 서문
서장 ‘일국사’를 뛰어넘는 조선 출판문화사-연구의 대상과 과제
1. 한국 출판문화의 기원
2. 신문관의 창립자 최남선
3. 연구사
4. 연구 방법과 사료
5. 내용 구성
제1장 출판사 신문관의 설립과 『소년』의 창간
1. 최남선의 일본 체험
2. 신문관과 『소년』에 나타난 일본의 영향
3. 계몽의 수단으로 수용한 일본 책
제2장 신문관의 어린이 잡지와 일본의 아동문학계-조선의 식민지화와 무단정치 속에서
1. 어린이 잡지 간행의 배경과 최남선의 어린이관
2. 어린이에게 다가갈 수단으로 선택한 일본의 책
3. ‘조선적인 것’을 통한 민족적 자부심의 함양
4. 어린이 잡지에서 ‘종합교양’ 잡지 『청춘』으로
제3장 『청춘』이 지향한 것-‘세계적 지식’의 발신과 민중 계몽
1. ‘종합교양’ 잡지 『청춘』의 세계성
2. 집필자들의 세계 인식과 일본 경험
3. ‘세계적 지식’의 발신 방법
4. 『청춘』의 종언
제4장 신문관의 간행물과 여성
1. 근대 조선의 여성을 위한 간행물과 신문관
2. 보호국기의 여성관과 『소년』
3. 1910년대의 여성 담론과 신문관의 어린이 잡지
4. 근대 조선의 출판 역사에 나타난 획기적 특성
제5장 시리즈 서적의 시도-한국병합 전후의 단행본
1. 신문관의 다종다양한 단행본
2. 총서 기획과 그 배경
3. 번역소설 시리즈와 일본의 출판사
제6장 신문관의 첫 번째 스테디셀러 『시문독본』의 편집 과정-3·1독립운동 전야의 단행본
1. 조선 최초의 현대문 교과서 『시문독본』
2. 『시문독본』과 일본 중등국어교과서의 관계
3. 『시문독본』의 독자성
4. 『자조론』의 재구성과 계몽의 수법
제7장 시사주보 『동명』과 신문관의 종언-3·1독립운동 뒤 최남선의 출판활동
1. 3·1독립운동과 신문관
2. 신문관에서 동명사로
3. 『동명』의 개요와 간행 목적
4. ‘민족적 완성’을 향한 노력
5. 『동명』의 오락 요소-신문관의 잔상
종장 조선 출판문화의 탄생
1. 그 뒤의 동명사
2. 신문관·최남선과 근대 일본
3. 앞으로 남은 과제
후기
추천의 글
부록
최남선 연보
신문관과 동명사의 잡지에 실린 번역 기사의 저본 일람
참고문헌
찾아보기
간행사
최남선을 비롯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일본의 문헌을 활용해서 민중계몽을 의도하고 독자적인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려 했는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목적이다. 또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참고한 일본의 출판계는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조선에서 출판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 이 책의 시도는 조선의 출판 역사를 세계사의 틀에서 파악하는 작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책을 계기로 한국의 독자 여러분이 조금이나 일본의 ‘출판’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미디어와 역사, 문학연구자 사이의 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한국의 출판문화에서 최남선과 신문관이 도맡은 기념비적인 공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근대 초기의 강렬한 계몽성이나 민족주의적 성격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사정이 엄연하다. 최남선이 일본 출판계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앞장선 사실은 늘 거론되건만 막상 구체적인 실상이나 의미는 소홀히 다루어지곤 했다. 신문관에 의해 소년과 청년 주체가 발견된 장면 못지않게 어린이 독자를 창출하며 새로운 독서 시장을 개척한 선구적인 역할 역시 새삼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최남선과 신문관의 면면은 확연해 보일 법하지만 여전히 일면적인 평가에 머물거나 일국적인 경계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편협하기까지 하다. 근대 출판문화의 이면과 배후를 꿰뚫어 보면서 최남선과 신문관의 전모를 더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조감하기 위해서는 균형 갖춘 시각과 태도가 절실하다.
― 「추천의 글」 중에서
저자
다나카 미카 田中美佳, Tanaka Mika
1990년 사가현(佐賀)에서 태어났다. 규슈대학(九州大) 대학원 인문과학부 역사공간론(史空間論) 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문학박사. 전공은 조선근대사, 미디어사. 현재 가고시마국제대학(鹿島際大) 국제문화학부 강사이다. 주요 업적으로 「식민지기 조선의 민간 독본-1920년대 초의 청년 독본을 중심으로(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民間本-一九二年代初頭の年本を中心に)」(『韓朝鮮の文化と社)』 제21호, 2022), 「『중등조선어작문』(1928)의 성립 과정-1920년대 조선출판계의 일단면(『中等朝鮮語作文』(一九二八年)の成立過程-一九二年代における朝鮮出版界の一面)」(『年報朝鮮』 제25호, 2022) 등이 있다. 이 책 『朝鮮出版文化の誕生-新文館・崔南善と近代日本』으로 2022년도 일본출판학회상 장려상을 받았다.
역자
박천홍 朴天洪, Park Cheon-hong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고 현재 (재)현담문고에서 학예사로 일한다.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철도로 돌아 본 근대의 풍경』(산처럼, 2003),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서양과 조선의 만남』(현실문화연구, 2017), 『활자와 근대-18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너머북스, 2018) 등을 썼고, 이병헌의 『중화유기-근대 한국인의 첫 중국여행기』(공역, 빈빈책방, 2023)를 옮겼다.